'삼겹살-마블링 교' 신자들이 알아야할 것 세가지
<김헌식의 문화 꼬기>지방섞인 고기의 문화지체성, 획일성 피해야
흔히 우리는 삼겹살이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이 삼겹살이 각광을 받은 것은 조리시설에 도시가스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90년대 초반 화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면서 순식간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출시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삽겹살을 구워먹는 일이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이 삶의 낙이 되기도 했으며 가족 피크닉의 대명사처럼 보여졌다. 즉석에서 고기를 바로 구워 야채에 술한잔할 수 있는 점은 최고의 조합으로 보였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특징에 맞아보였다. 이른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행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고기를 먹는 것이 몸 보신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삽겹살을 빨리 구워먹는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낳았다. 이러한 삽겹살은 분명 맛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방 자체가 타면서 고기를 굽기도 하지만, 지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 때문이기도 하다. 삼겹살은 해외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데, 그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이를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잘 먹지 않는 특히 서구인들이 배제하는 이유는 기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기의 지방은 술과 함께 하면 통풍을 유발하고, 남성들의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는 식문화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다. 특히, 지방과 알콜이 엉겨서 심혈관을 막히게 하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뇌졸중과 같은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상 삼겹살은 인스턴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음식 조리 스타일인 탕과 발효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있었다. 솥뚜껑 삽겹살이 등장해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미했지만, 그것은 전통방식과는 달랐던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고소한 맛을 전달하면서 섭취욕망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해내기가 힘겨운 음식이며 갈수록 비만을 불렀다.
물론 젊은세대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는 곧잘 발생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서도 뇌동맥류환자가 자주 관찰된다. 하지만, 이미 입맛이 길들여지므로 바꾸기기는 쉽지 않다. 원해 삽겹살은 잘 먹지 않는 부위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했으나 이런 선호성 때문에 20여개국에서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작 돼지에서 나오는 분량은 10% 내외일 뿐이다. 그것을 먹기 위해 돼지를 더 사육해야 하는 것이다.
쇠고기 마블링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마블링은 바로 지방층이 얼마나 있는가에 관련한 것인데 그것이 쇠고기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1등급으로 나누는 것에 지방이 작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그것에 하나하나 개입할 근거가 약하며 그렇지 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한국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렇게 등급을 정하지 말아야하는가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이 만드는 마블링이 쇠고기의 등급을 결정할 수 없으며, 그것이 맛의 평가 기준이 될수는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육우기간이나 환경과 조건, 고기 신선 상태 등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블링도 결국 지방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이 있으면 식감을 높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지방을 찾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맛을 결정하는 최고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에 대해서 건강상으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의 등급이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설탕 논쟁의 핵심도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 이전에 획일성에 있었다. 설탕을 넣으라고 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설탕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동참겠다고 적극 정책적 의지와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물론 설탕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체인공감료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달게 먹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당연시 인정하는 수동적 태도를 낳는다. 방송에서 설탕을 아예 넣지 않을 수 없다면, 조금씩 개인 차이에 맞게 넣으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설탕에 더 취약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듬뿍듬뿍 넣으라고 말하는 것은 설탕회사의 이익만을 올려준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삼겹살도 마찬가지다. 마치 한국음식의 대표적인 메뉴인것처럼 말하는 것도 획일적이다.
또한 회식 문화에서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강조가 무수한 생명을 파괴하며 그 파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 그것이 성인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이상 고기를 보양식도 아니며 너무 과잉되어 있다. 그 과잉되어 있는 영향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줄 것인가를 생각했을 보양식과 외식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일률적으로 강요할수는 없다. 정부가 설탕량을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서 요리를 한 가족 구성원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글/김헌식 문화평론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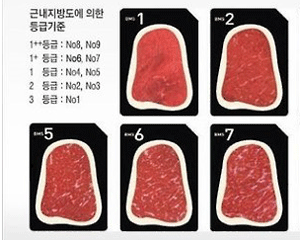 현행 쇠고기 육질 등급은 마블링(근내지방)으로 예비등급을 판정하고서 육색(살빛),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하자가 있으면 등급을 내리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연합뉴스
현행 쇠고기 육질 등급은 마블링(근내지방)으로 예비등급을 판정하고서 육색(살빛),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하자가 있으면 등급을 내리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연합뉴스